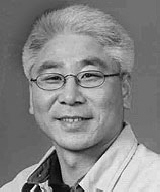■곤충의 생태달력과 생태시계
우리 주변의 꽃들이 저마다 피고 지는 시기가 따로 있듯이 곤충들도 저마다 태어나 활동하는 시기가 다르다.
봄이 찾아와 동네 어귀 양지쪽에 냉이 꽃이 흐드러지게 필 무렵이면 겨우내 번데기 형태로 추위를 견뎌내던 배추흰나비가 어김없이 껍질을 벗고 너울너울 춤을 추고, 녹음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4월 중순쯤이면 탱자나무 가지에 매달려 월동을 마친 호랑나비 번데기 역시 탈피과정을 거쳐 멋들어진 자태를 드러낸다.
또 7,8월 무더위가 시작되면 각종 매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날개돋이를 마치고 독특한 울음소리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며, 가을이면 여기저기서 귀뚜라미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계절이 겨울로 가고 있음을 전해준다.
곤충들은 또 ‘4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의 시간 흐름’을 정확히 알아차려 그들의 생활에 리듬을 주고 있다. 들꽃에 꿀벌이 가장 많이 날아드는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이며, 귀뚜라미와 바퀴벌레는 하루해가 저물어야만 활발히 움직인다.
송충이 같은 나방 애벌레들도 하루 종일 이파리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오전과 오후 몇 차례씩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섭생과 휴식을 반복한다.
이렇듯 곤충들은 종에 따라 일년간의 활동주기와 하루 동안의 생활리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곤충 생태달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곤충들은 매년 같은 시기에 태어나 자라나고 생식을 하며, 하루 동안의 생활도 매일 같은 흐름으로 영위해 나가는데 그것이 마치 연중계획과 하루일과표에 의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곤충 생태달력은 이 지구상의 곤충들이 온도, 먹이 등 생활조건의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또한 곤충 달력은 수많은 종류의 곤충들이 저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계절적인 질서를 유지시켜 준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자연 생태계는 혼란의 연속일 것이다.'
'곤충의 생태시계 '
야행성 곤충들이 해가 넘어간 후에서야 먹이활동을 하는 것은 그들 체내에 시간의 흐름을 광주기를 통해 정확히 감지하는 일종의 시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해가 진 뒤 상수리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기 위해 모여든 곤충들./자연닷컴
가을에만 나타나던 곤충이 어느 해부터 갑자기 봄과 여름에 나타나기 시작해 시도 때도 없이 들끓게 됐을 때의 자연 생태계를 생각해 보라. 그 자연생태계는 이미 계절적인 질서가 깨진 상태이며, 그러한 상태에서는 먹이사슬의 균형도 자연히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그 어떤 시스팀이 곤충들로 하여금 계절적인 변화를 알게 하고 하루 동안의 시간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게 하는 것일까.
이같은 의문의 실마리는 식물의 개화(開花) 시기가 광주기, 혹은 명암사이클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이를 ‘식물 생태달력’이라 함)이 알려지면서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는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 곤충들도 그와 비슷한 시스팀을 통해 계절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곤충들은 밤낮의 길이(명암의 시간)가 변화하는 것을 체내의 특수한 장치(곤충 시계)를 통해 감지해 자신들의 연간주기 리듬(곤충 생태달력)을 유지하는데 활용하고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곤충들로 하여금 이 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 쏟아지는 빛의 양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명암 시간이며, 이것이 곧 자연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나아가 ‘자연계의 총체적인 생태달력’을 성립시키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또 빛의 양은 날씨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지만 밤낮의 길이(명암사이클)는 계절에 따라 규칙적인 주기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들어 ‘곤충들은 명암사이클에 의한 계절주기의 영향을 받아 어느 시기에는 알을 낳고 어느 시기에는 날개돋이를 하는 등 각각의 생활사를 영위해 나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례로 진딧물이 명암사이클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생활사를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알아보자. 진딧물은 일년 중 생활조건이 좋은 봄과 여름에는 날개가 없는 개체가 생겨나 각기 단성생식을 통해 급속히 번식하지만 가을에는 날개가 있는 수컷과 날개가 없는 암컷이 각기 태어나 유성생식을 한 다음 이들이 낳은 알로써 겨울을 지내는데,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명암사이클(광주기)인 것이다.
'진딧물과 명암사이클'
진딧물은 봄,여름에는 날개가 없는 개체들이 태어나 단성생식을 하지만 가을에는 날개가 있는 수컷과 날개가 없는 암컷이 태어나 유성생식을 하는데 이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명암사이클이다./자연닷컴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곤충의 어느 부위에 명암사이클을 감지하는 장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실험을 한 바 있다.
즉, 1960년대 A.D Lees라는 학자는 진딧물의 몸 구석 구석에 가느다란 빛을 비추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광주 반응이 나타나는 곳은 눈이 아니라 뇌 중앙 뒤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아냈으며, C.M Williams는 집누에를 이용해 뇌의 각 부위와 뇌 주위의 신경색을 자르는 등의 실험을 통해 뇌의 두엽부(頭葉部) 중앙 옆의 신경분비세포군 부근에 ‘광주반응 장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의 광주반응 장치는 명암사이클을 감지해 계절 및 시간 변화를 알아차리는 메카니즘으로서 흔히들 ‘곤충의 체내 시계(곤충 시계)’라고도 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카로티노이드란 색소계가 이 장치의 주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리하자면 곤충의 뇌 속에는 카로티노이드란 색소계로 이뤄진 명암사이클 인식장치(곤충 시계)가 있어 이를 통해 계절 및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감지해 산란, 부화, 탈피 등의 각종 생명현상을 영위함으로써 각각의 곤충 생태달력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우리주변의 곤충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8)곤충의 의사소통 (0) | 2020.09.02 |
|---|---|
| (6) 곤충의 공생과 기생 (0) | 2020.09.02 |
| (5)먹이잡이 지혜 (0) | 2020.09.01 |
| (3) 위장술과 의태 (0) | 2020.09.01 |
| (1)서론 (0) | 2020.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