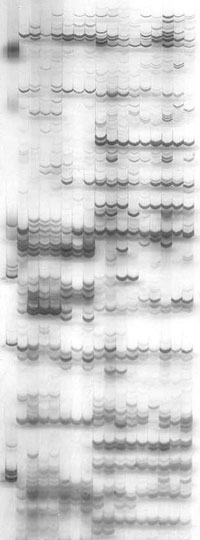무분별한 이식으로 수중생태계 위협

'어류 이식'이라고 하면 흔히 '외국 서식 어류의 국내 이식'을 먼저 생각하고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어류 이식(또는 도입)에는 ▲외국 서식 어류의 국내 이식 외에도 ▲국내 서식 어류의 국내 다른 수계로의 이식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반드시 고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특히 환경 및 생태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소위 환경운동단체의 회원들 마저도 어떤 외래어종이 어느 수계에 어느 정도 확산돼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큰 비중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작 국내 서식 어종의 국내 다른 수계로의 이식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는 사이 국내 서식어종의 다른 수계로의 이식작업이 빈번히 이뤄져 이식 어종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같은 현상과 추세는 교통과 운송 수단의 발달로 매우 빠르게, 그리고 다량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정도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또한 토착어종의 양식어종화 및 관상어화 사업이 이뤄지면서 그같은 현상과 추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국내 서식 어종의 다른 수계로의 이식 및 그로 인한 영향 등에 관한 국민 대다수의 무관심과 무지가 국내 어류의 무분별한 이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밑바탕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행히도 국내에는 그동안 많은 어류학자들의 노력 결과 국내 토착어종의 분포 조사가 비교적 잘 돼 있고 원래의 분포지역 또한 상세히 알려져 있는 까닭에 최근까지의 이식현황을 종합 고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간의 학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국내 서식어종의 다른 수계로의 이식 현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흰줄납줄개=잉어과 납줄개아과의 어류로 본래 한강,금강,임진강,낙동강,영산강,탐진강,섬진강 등에만 서식 분포하던 것이 최근에는 형산강과 왕피천, 강화도에까지 확산돼 발견되고 있다. 이식경로는 불분명하나 타 어종의 이식 때 함께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시붕어=잉어과 납줄개아과의 어류로 본래 임진강에서 한강,금강,섬진강,낙동강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하는 가운데 특히 남부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어종이었으나, 태화강과 형산강에는 서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하천에서도 이 어종이 발견되고 있다. 태화강의 각시붕어는 낙동강의 용수를 양수 방류하면서 이입된 것으로 보이며 형산강의 이입경로는 불분명하다.

▲큰납지리
=잉엇과 납줄개아과의 어류로 본래 임진강,한강,금강,섬진강,낙동강 등에 걸쳐 널리 분포했으나 형산강 수계에는 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형산강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역시 유입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고기=잉엇과 모래무지아과의 어류로 예전에는 임진강에서 섬진강에 이르기까지 전 수계에 서식 분포했으나, 형산강에는 분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형산강에서도 출현하고 있다. 이입경로는 불분명하다.
▲돌마자=잉엇과 모래무지아과 어류로 임진강에서 낙동강까지 거의 모든 하천에 서식 분포했으나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울진 왕피천에는 분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입경로는 역시 불분명.
▲피라미=잉엇과 황어아과 어류로 과거 분포하지 않았던 태화강,형산강,영덕 오십천,왕피천,강릉 남대천,양양 남대천,연곡천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연곡천의 피라미는 인근 양어장에 유입된 것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른 하천은 불분명하다.

▲끄리
=잉엇과 황어아과 어류로 과거 낙동강과 마읍천에는 분포하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이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동자개 등 다른 이식어종의 방류 때 함께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치리=잉엇과 강준치아과 어류로 과거 분포하지 않았던 낙동강 수계와 울진 매화천에서도 최근 발견되고 있다. 유입경로는 불분명하다.
▲산천어=본래 송어와 같은 종으로 하천에 남아 육봉형으로 자란 것이 산천어이다. 울진 이북의 동해로 흘러드는 여러 하천에 분포했으나 왕피천과 한강 수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들 수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양어장으로부터의 확산과 지자체에서의 방류사업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동자개=동자갯과 어류로 과거에는 낙동강 수계에는 분포하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발견되고 있다. 양식장에서 도입한 것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눈동자개=동자갯과 어류로 낙동강 수계에 분포하지 않았던 것이 최근 이곳 수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유입경로는 불분명하다.
▲대농갱이=동자갯과 어류로 낙동강 수계에 없던 것이 최근 채집되고 있다. 역시 유입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퉁가리
퉁가릿과 어류로 과거에는 강릉 남대천과 연곡천,간성 북천에는 없었으나 최근들어 소수가 채집되고 있다. 유입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미유기=메깃과 어류로 양양 남대천,연곡천에 살지 않았으나 근래들어 이곳서도 발견되고 있다. 불분명한 유입경로를 갖고 있다.
▲가시고기=큰가시고깃과 어류로 과거 존재하지 않던 충북 제천의 의림지에서도 살고 있다. 일제 때 빙어의 유입과정에서 함께 이식된 것으로 보인다.
▲꺽지=농엇과 어류로 양양 남대천,간성 북천에는 없었으나 요즘 발견되고 있다. 양양 남대천의 것은 주민들에 의해 이식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북천의 것은 미확인.
▲웅어=멸칫과의 기수성 어류로 본래 서남해로 흘러드는 강 하구에 살았으나 최근에는 울산 태화강에서도 채집되고 있다. 낙동강에서 용수 공급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황쏘가리=본래 쏘가리와 같은 종으로 돌연변이에 의해 태어난 종이다. 한강수계에만 서식했으나 최근들어 양식에 의한 관상어화 바람으로 전국에 분양되면서 각 하천으로의 유입 및 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한국 어류이식 80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중생태계 진단 (24)어종별 특성: 미꾸리류 (0) | 2020.09.23 |
|---|---|
| 수중생태계 진단 (22)어종별 특성: 비단잉어 (0) | 2020.09.23 |
| 수중생태계 진단 (21)어종별 특성: 중국붕어류 (0) | 2020.09.23 |
| 수중생태계진단 (20-1)긴급분석: 잡종붕어의 실체④ (0) | 2020.09.23 |
| 수중생태계진단 (20)긴급분석: 잡종붕어의 실체③ (0) | 202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