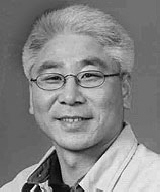올해가 '입춘 없는 무춘년(無春年)'이라더니…
범띠 해인 올핸 입춘이 없는 무춘년(無春年)이라더니 그 말이 기막히게 들어맞았다. 봄은 왔었는데 겨울 품을 벗어나지 못한, 봄 아닌 봄이었기 때문이다.
화창한 날씨를 보이다가도 걸핏하면 추위가 찾아와 103년만의 4월 한파란 새기록을 세우더니만 급기야 며칠전엔 속리산에 눈까지 내렸다. 4월 하순에 눈이라니, 이변도 보통 이변이 아니다. 속리산 자락에 핀 산벚꽃을 개칠하듯 하얗게 내린 눈을 바라본 사람들은 뜬금없는 광경에 혀를 내둘렀다.
지금이 어느 땐가. 내일(5일)이면 입하다. 여름문턱에 들어서는 날이니 절기상으론 엄연히 초여름이다. 더구나 보름뒤엔 더위가 시작돼 여름기분이 든다는 소만이다. 그때면 식물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 본격적인 여름이다.
그런데 작금의 날씨는 어떤가. 5월 들어 예년기온을 되찾았다는 날씨가 마치 어린애가 온·냉탕을 오가며 뛰놀듯 기고만장이다. 낮이면 햇볕이 쨍하다가도 저녁과 아침이면 수은주가 마냥 내려간다.
농민들은 올해들어 줄곧 죽을상이다. 유례없던 겨울추위 끝에 봄을 맞았으나 우수에서 곡우까지 봄절기 다가도록 봄 같지 않은 봄날씨가 천방지축 이어져 큰피해를 입는 바람에 절망을 옆에 끼고 산다. 이미 얼어죽은 과수목과 담배묘,고추묘,감자싹 등은 이제 신물이 나 쳐다보기도 싫단다.
우리주변의 초목·곤충들은 또 어떤가. 만개해야 할 꽃들은 피는 도중 얼어붙어 시커멓게 변하기 일쑤고 나뭇가지에선 새이파리들이 흡사 사람머리에 기계충 걸린 것처럼 듬성듬성 돋고 있다. 제초제를 뿌린들 그런 흉한 모습을 할까. 매년 이맘때면 지천으로 날아들던 벌과 나비는 정신없는 기온변화에 혼이 빠진듯 제몸 추스르기 바쁘다. 어쩌다 보이는 벌과 나비는 힘겨운 날갯짓으로 측은지심을 부른다.
봄이 실종된 게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겨울에서 봄을 건너뛰고 곧바로 여름날씨로 치달은 게 어디 한두 해 있었던 일인가. 다만 올해의 경우엔 겨울날씨에서 곧바로 여름날씨로 건너뛰질 않고 이상저온 현상이 장기간 그리고 더욱 잦게 이어지면서 생태리듬의 도미노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이 다르다. 입하가 코앞인데 벚꽃과 목련꽃이 벌어지고 개나리가 이제서야 피는 지역이 부지기수다. 절기가 이른 것도 있지만 날씨영향이 더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춘년의 위력을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없다. 더군다나 무춘년엔 불길하다는 속설까지 있으니 세상사 돌아가는 꼬락서니와 함께 적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의 무춘년은 지난해(음력 2009년 소띠 해)에 입춘을 빌려준(?) 결과다. 지난해엔 음력으로 1년 사이에 입춘이 2개였다. 이른바 양두춘(兩頭春)의 해였다.
속설에서는 양두춘엔 길하고 무춘년엔 불길하다고 전한다. 속설을 꼭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뜩이나 경험칙으로 보면 속설이 길사엔 잘 맞지 않고 흉사엔 비교적 잘 맞는 까닭에 앞으로 남은 2010년이 더욱 걱정된다.
지금까지 얼마나 시끄럽고 다사다난했는가. 불과 3분의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마음은 연말에 와있는 느낌이다. 하나가 잠잠해지면 또 다른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세상을 놀라게 한다. 사회적 긴장의 연속이다. 천안함 참사로 놀랐던 가슴 간신히 추스르고 나니 이번엔 또 구제역이 전국을 불안지대로 만들고 있다.
달력(음력)에도 입춘이 없고 기후상으로도 봄날씨가 실종된 유별난 해라서 그런지 세상사까지도 유별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 부디 계절에 맞는 날씨, 절기에 맞는 생태리듬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더이상 가슴 덜컹 내려앉는 일이 생기지 않는 남은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 봄날에…
'뱁새의 생태풍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쇠뜨기 열풍의 부끄러운 경험을 벌써 잊었는가 (0) | 2010.06.03 |
|---|---|
| 위장망 안에서 '평화로운 자연'을 보다 (0) | 2010.06.03 |
| 선유동에 새겨놓은 자랑스러운(?) 이름들 (0) | 2010.04.27 |
| 갑자기 끊긴 '혼새' 울음소리가 궁금하다 (0) | 2010.04.20 |
| 조난 위기에서 멧돼지 길을 만나다 (0) | 2010.04.13 |